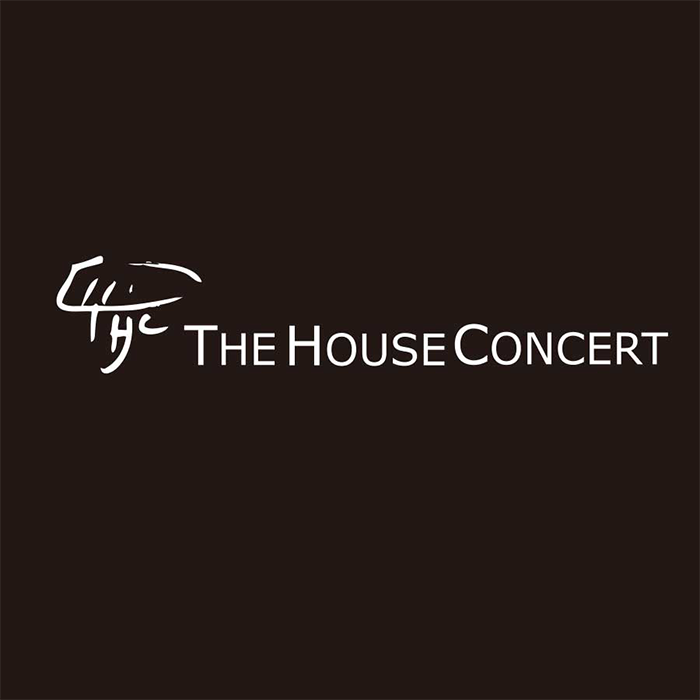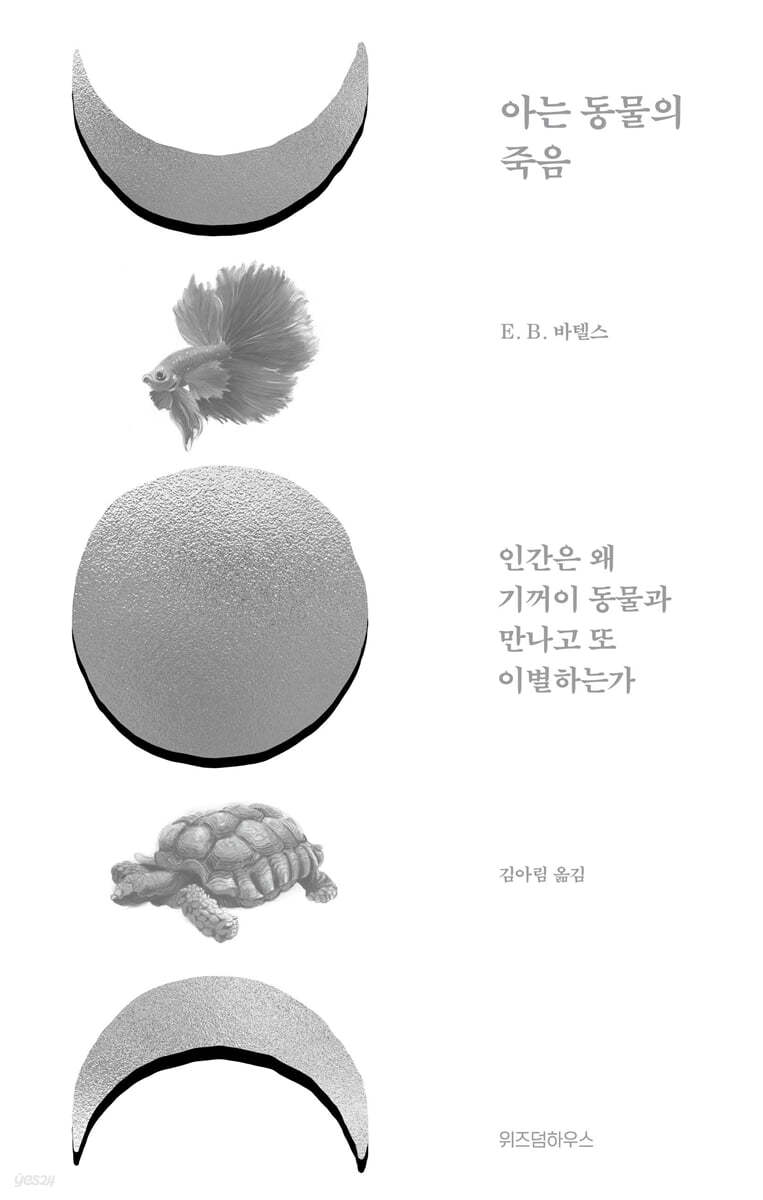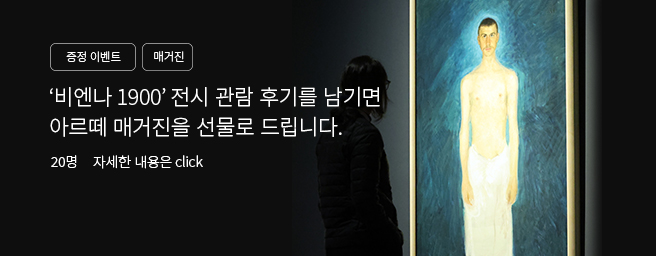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미국에선 반려동물과 다양한 형태의 이별 의식을 치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뉴욕주에선 반려동물이 비영리 묘지에 합법적으로 묻힐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텍사스주 엘로이즈숲 자연추모공원에는 반려동물 전용 구역이 따로 있다. 가족 묘지에 76마리의 동물이 묻혀 있고, 보호자와 같은 묘지에 매장된 동물도 3마리가 있다. 유골을 항아리에 넣어 장식장에 올려놓고, 기르던 고양이의 털로 스카프를 짠다. 반려동물과 닮은 봉제인형을 주문해 곁에 두기도 한다.
한국도 비슷하다. 미국처럼 다양하진 않지만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러주는 전문 업체가 늘고 있고 반려동물장례지도사도 등장했다. 경조 휴가 제도에 ‘반려동물 장례 휴가’를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웰즐리대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부서에서 선임 편집작가로 일하는 E. B. 바텔스는 이처럼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을 추모하는 사례들과 자신의 경험을 <아는 동물의 죽음>에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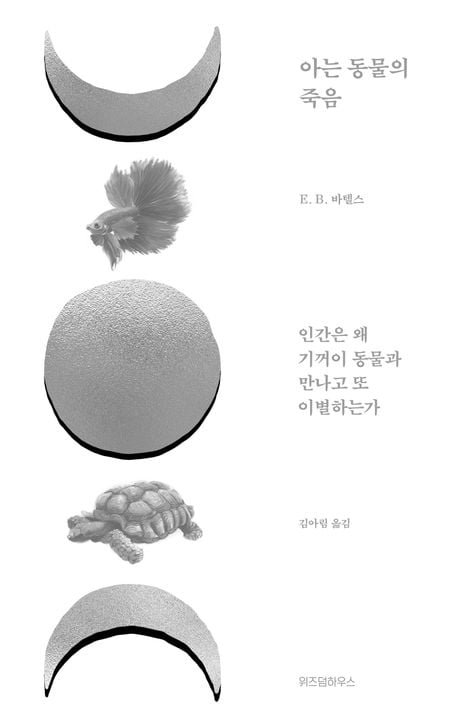
저자는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에 대해 ‘권리를 박탈당한 슬픔’이라고 말한다. 분명히 큰 슬픔인데도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을 잃었을 때처럼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을 뜻하는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보호자들은 ‘별것 아니니 얼른 극복하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저자는 충분히 추모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인간이 동물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해온 기간은 꽤 오래됐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고양이가 죽으면 추모의 의미로 온 가족이 눈썹을 밀었다. 또한 죽은 반려동물을 천으로 감싸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미라로 만들었다. 죽은 뒤에도 영혼엔 몸이라는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중세시대엔 사체를 박제했다. 유전자를 복제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떠난 동물을 기억하고 추모해왔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잃은 기억이 있다면 책 곳곳에서 자신과 닮은 사례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새, 거북이, 햄스터 등 다양한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대가다. 이런 상실의 아픔을 겪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우리는 왜 마음의 상처를 저당 잡히는 걸까.
저자는 이에 대한 답으로 “사랑하고 잃는 것이 아예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시인 앨프리드 테니슨의 말을 제시한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잘 작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다독인다. “동물을 키운 경험은 우리를 크게 변화시키거나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보다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도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금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