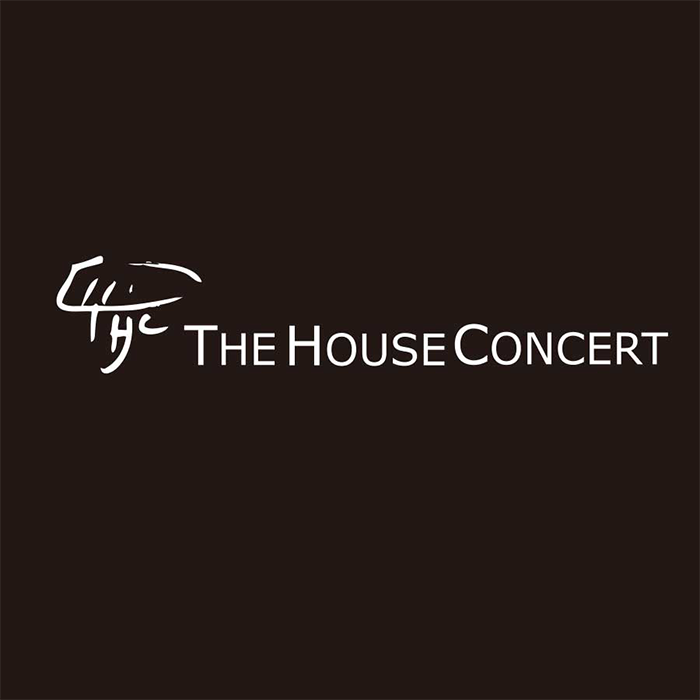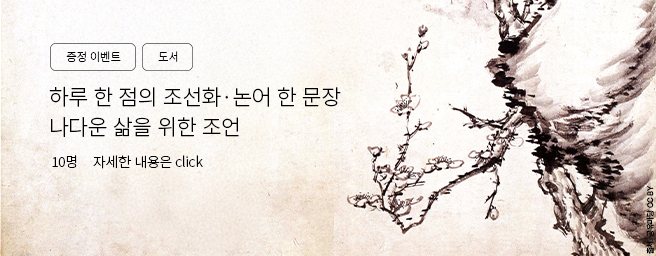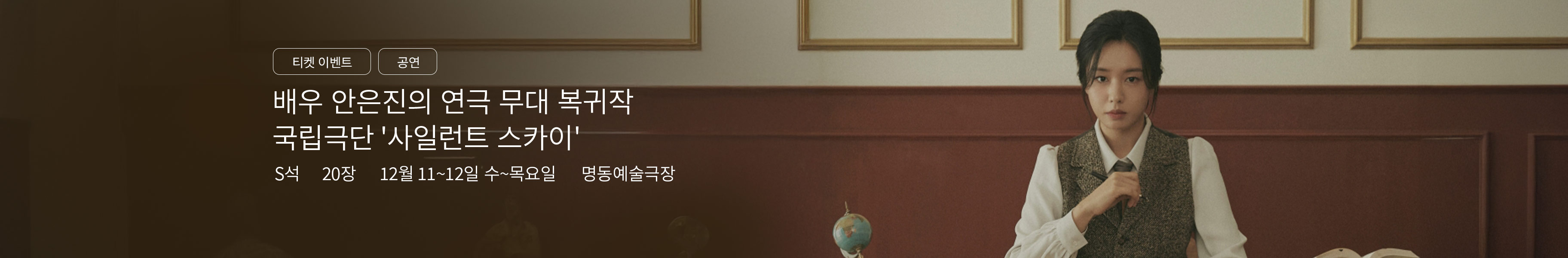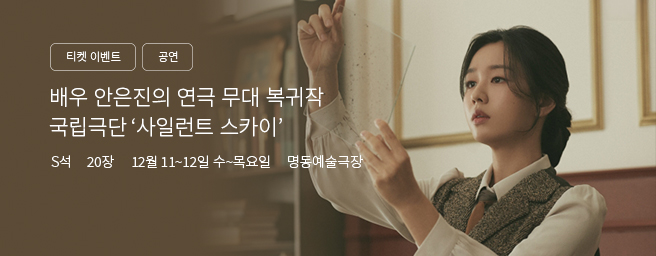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 출처. No Film School
인류가 가장 사랑했던 영화를 도감으로 만든다면, 아마도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들, 그리고 그의 영화 속 아이코닉한 장면들 (예를 들어 <E.T.>에서 자전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지 않을까?

영화 <E.T.> 스틸컷 / 출처. 네이버 영화
그 존재와 재능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감독이지만 사실상 스필버그는 ‘가장 많은 기록’을 가진 감독이기도 하다. 그는 영화산업에서 ‘블록버스터’라는 장르를 탄생시킨 인물이고 (<죠스>, 1975), 아카데미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작품, 13편을 ‘Best Picture (최고 작품상)' 부문에 올린 인물이기도 하다. 이외의 시상식에서 받은 상까지 합치면 그가 받은 트로피는 209개 (노미네이션은 325개)에 달한다. 이쯤 되면 스필버그에게 더 이상 상으로 주는 영예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무엇보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감독이기도 하다. 올해 77세를 맞은 현재까지 거의 매년 한 편의 영화를 개봉시키고 있으며 (제작 크레딧 포함) 여전히 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창조적인 활약을 지속하고 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 출처. Golden Globe Awards 홈페이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인 스필버그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데뷔했다. 첫 장편 영화 <듀얼>(1971) 역시 텔레비전용 영화였지만 미국뿐 아닌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으면서 스필버그는 할리우드로 입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의 진정한 영화 데뷔라고 한다면 그다음 작품 <슈가랜드 특급>(1974)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영화는 부잣집으로 강제 입양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찾아오기 위해 탈옥하는 남편과 그의 아내의 여정을 다룬 로드 무비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보니 앤 클라이드>(감독 아서 펜, 1967)의 파괴적인 에너지와 누벨바그를 향한 미국 신인 감독의 열망이 투영된 수작이다. 영화는 그 해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다.

[위] 영화 <슈가랜드 특급> 포스터 / 출처. 다음영화 [아래] <슈가랜드 특급> 촬영 현장의 배우 윌리암 아서톤과 스필버그 / 출처. IMDb
아쉽게도 <슈가랜드 특급>은 평단의 인정은 받았지만 흥행에는 실패한 작가주의적 영화였다. 그럼에도 감독으로서 스필버그의 미학적 지향점을 확고히 했던 영화의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그의 다음 행보는 다소 예상 밖의 것이다. 그는 곧바로 <슈가랜드 특급>을 제작했던 리차드 D. 자눅과 데이비드 브라운의 또 다른 프로젝트 <죠스>에 투입되었다. 블록버스터의 초석이자 여름 영화의 아이콘인 <죠스>는 사실상 최종 제작비의 3분의 1 정도로 기획되었던 중예산의 호러·스릴러 프로젝트였다 (애초부터 메가급 영화였다면 26세의 신인 감독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촬영이 난항을 겪으며 제작비는 3배에 가까운 9백만 달러까지 치솟았고, 주연배우인 리차드 드레이퓨즈에 따르면 촬영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그들에겐 스크립트도, 캐스트도, 상어조차도 없었다 (We started the film without a script, without a cast and without a shark.”).

[위] 영화 <죠스> 스틸컷 / 출처. 다음영화 [아래] <죠스> 촬영 현장의 스필버그 (왼쪽 사진), 스필버그와 배우 리차드 드레이퓨즈 (오른쪽 사진) Photo by mptvimages.com - Image courtesy mptvimages.com / 출처. IMDb
물론 나머지 스토리는 우리 모두가 아는 전설이다. 모두가 염려했던 이 호러 프로젝트는 블록버스터 역사의 시작이자, 스필버그 역사의 시작을 알렸고 이후 그는 <인디아나 존스>, <E.T.>, <쥬라기 공원> 시리즈 등 전 세계의 스크린을 차지하는 흥행 영화의 주역이자 아메리칸 시네마의 얼굴이 되었다.
그럼에도 스필버그의 이력, 혹은 장기를 블록버스터 영화로 한정 짓는 것은 그의 경이로운 필모그래피의 반쪽만 조명하는 것이다. 그가 1985년에 연출한 <컬러 퍼플>은 스필버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추적인 터닝포인트가 된다. 앨리스 워커가 퓰리처상을 받은 소설 원작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백인 감독으로서 대공황 시기를 거치는 흑인 여성들의 삶을 재현하는 야심 차면서도 어쩌면 위험한 프로젝트였다. 영화의 제작을 맡은 퀸시 존스가 스필버그에게 연출을 제안했을 때 그가 주저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 스필버그의 우려에도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이로써 여름 블록버스터의 대가를 넘어선, 역사물과 캐릭터 스터디까지 완벽하게 구현해 내는 거장으로 추앙받게 된다.

[위] 영화 <컬러 퍼플> 스틸컷 / 출처. 다음영화 [아래] <컬러 퍼플> 촬영 현장의 스필버그 / 출처. IMDb
스필버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주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작품은 바로 <쉰들러 리스트>(1993)다. 지인의 권유로 참여했던 <컬러 퍼플>과는 달리 <쉰들러 리스트>는 오랜 시간 동안 스필버그 본인이 꿈꿨던 일종의 ‘숙원사업’이었다.
[2부에서 계속]
김효정 영화평론가•아르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