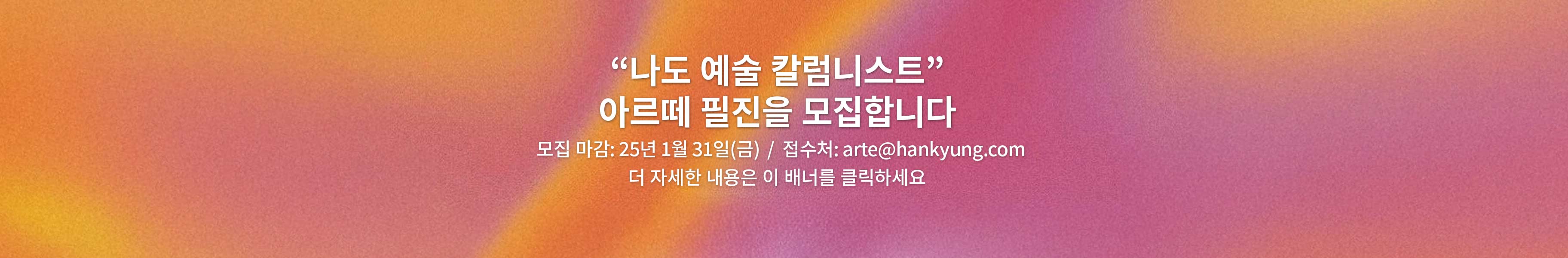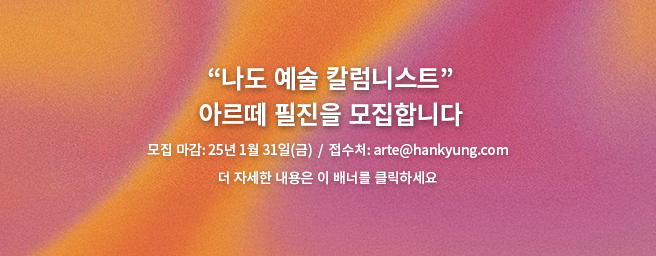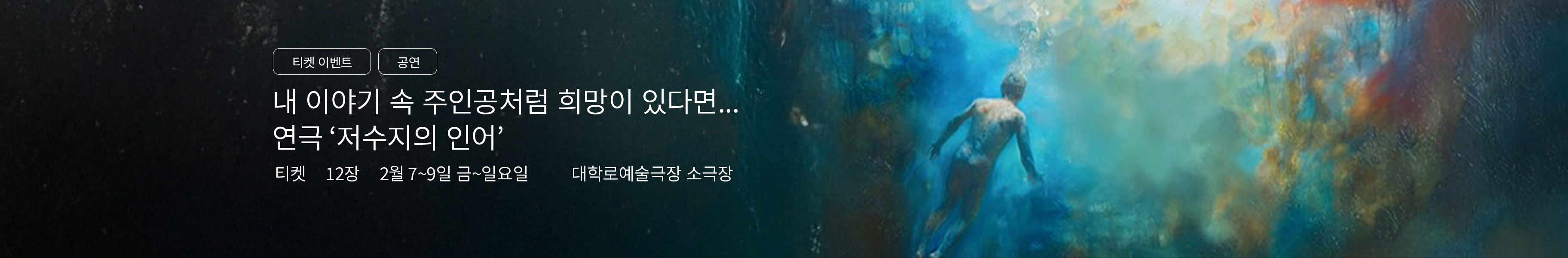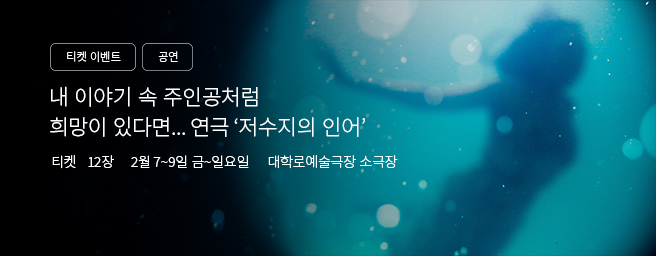김나영&그레고리 마스, 'Kitty Enlightenment' (2024). / 사진. ⓒ김상태, 제공. 에르메스 재단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계를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 쇼룸이 모인 도산대로엔 터줏대감처럼 에르메스 매장이 골목 초입을 지키고 있다. 올 겨울, '럭셔리의 상징'과도 같은 에르메스의 서울 매장 한가운데엔 '헬로키티 동상'이 떡하니 놓였다.
원래대로였다면 작고 귀여워야 할 헬로키티지만, 이 키티는 성인 남성이 눈을 들어 올려다보아야 할 만큼 거대하다. 하지만 이 '키티 동상'이 건물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유는 따로 있다. 동상에 금빛 후광이 비치기 때문이다.
에르메스 매장 가운데 후광 키티를 세운 작가는 아티스트 듀오로 활동하는 김나영과 그레고리 마스. 이들이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전시 '파라노이아 파라다이스'를 펼치고 관객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인 김나영과 독일인인 그레고리 마스는 오랜 작업 동료이자, 같이 삶을 꾸려가는 부부다. 김나영이 프랑스 파리 국립미술학교 유학 시절 같은 반이었던 마스를 만나 인연을 맺은 뒤 2004년 결혼했다. 올해 벌써 20년째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는 아티스트 듀오 김나영(왼쪽)과 그레고리 마스. / 사진. ⓒ김상태
부부는 아티스트 동료로, 또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세계를 돌며 전시를 열고 작품을 만들었다. 일본, 필리핀, 독일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노마드'처럼 떠돌며 살아왔다. 세계 여행을 펼치던 이들은 2019년 한국 땅에 정착했다. 양평에 작은 작업실을 마련한 뒤 그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작품을 만들고 있다.
부부는 항상 실용성과 효율성에 관심이 많았다. 버려진 물건들을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작업을 펼치는 이유다. 이번 전시에서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잡동사니들을 구해다 작품을 만들었다. '키티 동상'도 이렇게 탄생했다.
동네 공원에 버려진 대형 키티 조형물을 발견한 부부는 이 폐기물을 동상으로 변신시켰다. '세계인이 사랑하고 올해 탄생 50주년을 맞은 헬로키티를 색다른 동상으로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고양이 본체 주변에는 황금색 빛을 내는 전구들이 둘러싸고 있다. 마치 키티가 후광을 입은 모습을 표현했다. 작품의 이름도 '반야(般若) 키티'로 지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열리고 있는 김나영과 그레고리 마스의 개인전 '파라노이아 파라다이스'. 전시장 가운데에 '반야(般若) 키티' 동상이 자리잡고 있다. / 사진. ⓒ김상태, 제공. 에르메스 재단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문을 지키던 두 얼굴의 신 '야누스'처럼 부부의 키티도 2가지 얼굴을 가졌다. 앞에서 볼 땐 울고 있지만, 뒤쪽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하다. 이들은 키티 동상이 마치 신화 속 야누스와 같이 자신의 전시장을 지키는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하며 이 작품을 만들었다.
고양이 몸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통과 버려짐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실제 이들은 버려진 조형물에 어떤 가공도 하지 않았다. 오직 때가 탄 부분만 씻긴 뒤 부항을 떠 주듯 전구를 붙인 게 전부다. 버려진 물건들을 가공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다.
이처럼 김나영과 마스는 본래의 물건이 가진 순수함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잡동사니들을 작품으로 만들 때도 일정한 모양으로 깎고 만지는 대신 뒤죽박죽 배치한다. 자칫 작품들이 산만한 듯 느껴지는 이유다. 하지만 부부가 '의도된 산만함'을 택한 데는 오랜 기간 이어온 신념이 바탕이 됐다. “완벽한 것을 만들기는 쉽지만 순수함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나영&그레고리 마스, 'A Rough Day at the Workshop 1~5' (2024). / 사진. ⓒ김상태, 제공. 에르메스 재단
부부는 오로지 완벽함을 위해 이질적인 것들을 배제해 온 인간의 역사를 작품을 통해 꼬집는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김나영과 마스는 이 작업을 '프랑켄슈타인화'라고 이야기했다. 메리 셸던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죽은 시체를 모아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듯, 이들도 일상 곳곳서 만난 죽은 사물을 모아 새 생명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전시는 내년 2월 2일까지 이어진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